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 싱글벙글 찜질방 요금이 10만원이나 나온 이유 수인갤러리
- 백시) 초고도비만인 여시 있음..?보통 얼마나먹어 ㅇㅇ
- 훌쩍훌쩍 실시간 출근하는 사람들 난리난 한강대교사건 유미고양이
- 안싱글벙글 성인 페스티벌 ㄹ황의 ㄹ황의 ㄹ황의 ㄹ황 ㅇㅇ
- 스압)남단에서 북단까지 (3)[오키나와/홋카이도] 이번생은포기한
인터뷰) <포탈> 개발자가 한국어로 게임을 만들었다고?
퍼즐 게임 역사에 불후의 명작으로 남은 <포탈 시리즈>.그 <포탈>의 개발자 지프 바넷Jeep Barnet 씨가 최근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등장하셨습니다. 그것도 한국인 수준의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말이죠. 자신이 직접 만든 한국어 웹게임 <쌍근>을 플레이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경력이 워낙 뛰어난 분이시다보니 믿지 못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사실 지프 씨는 생각보다 더 대단한 인물입니다.단순히 <포탈> 개발에 참여한 것이 아닌, <포탈 시리즈>의 기원이 되는 <나바큘라 드롭>을 개발했고 그 작품으로 [밸브]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레프트 포 데드>, <팀 포트리스> 등의 역사적인 게임을 개발했죠. 단순히 년차만 봐도 19년차 베테랑 프로그래머입니다.그런데 그런 분이, 게임계에선 별로 존재감이 없는 한국 사이트에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게시글을 쓰시다니, 모두 놀랄 수밖에요.도대체 어쩌다가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요? 한국어를 활용한 게임 <쌍근>은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인디개발자가 된 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일까요?이번 포스트에서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지프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서른 개 가량의 다양한 질문을 모두 꼼꼼히 답해주셨는데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아래 답변은 모두 지프 씨가 직접 작성하신 원문이며, 에디터는 문단 나누기 외에 그 어떤 수정도 하지 않았습니다.Q. BIC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먼저 한국의 게이머분들께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A. 지프 바넷 Jeep Barnet안녕하세요! <포탈>을 개발한 지프입니다. 밸브에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레프트포데드>, <팀포트리스> 등의 시리즈도 개발했습니다. 요새 <쌍근>이라는 한글 낱말 맞추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산 인디 게임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요.# 한국에 관해Q.그 유창한 한국어 실력이 오직 독학으로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한국어는 언제부터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A.2018년부터 매일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원래는 앱과 팟캐스트로만 공부했는데 요즘엔 소설과 드라마로 언어교환을 해요. 한국산 게임을 하는 것도 한국어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되요.Q.한국어 자격증 시험도 보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자격증 시험을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A.작년에 TOPIK라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는데 6급 만점에 4급 자격증을 받았어요. 내년에 자격증이 만료될 거라서 시험을 또 볼 예정이에요.Q..한국어 외에도 배우고 싶거나 배우고 있는 언어 및 문화가 있나요?A.캐나다에는 영어와 불어를 많이 사용해요.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불어를 배운다면 좋지만 솔직히 한국어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Q.지프 씨의 스팀 큐레이터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보면, 스팀에 발매된 모든 한국산 게임을 플레이하고 리뷰하신 듯 합니다.한국인도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울텐데, 한국 게임이면 퀄리티와 관계없이 무조건 플레이하시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합적으로, 왜 한국의 게임에 꽂히신 건지 궁금합니다.A.몇년전에 한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하다가 한국어에 흥미를 잃을 뻔했어요. 우연히 한국산 게임을 하니 한국어 공부도 되고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게임을 하고 나서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게임 리뷰 글을 올렸어요. 그 이후에 원어민들이 제가 게임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의견을 들어서 일주일 2번씩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 시청자 분들께서 동기부여를 많이 주셔서 지금까지 업로드한 영상이 200개가 넘어요. 한국산 게임이면 퀄리티와 상관없이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제는 관심이 있는 게임만 하기로 했어요.Q.최근 디시인사이드의 인디게임 갤러리에 등장하셔서 아주 열렬한 반응을 받으셨는데요, 평소에 한국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돌아다니시나요?만약 자주 안 돌아다니신다면 인디게임 갤러리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A.제가 개발하고 있는 <쌍근>에 대한 피드백을 찾으려고 '쌍근'을 검색해봤는데 여러가지 갤러리가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쌍근>의 점수 공유 기능을 이용하셨지만 디시인사이드에서 게임에서 사용되는 이모티콘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디시를 위해서 이모티콘이 없는 공유 기능을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다음날에 인디게임 갤러리의 방장님께 이메일을 받았는데 제가 인사를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Q.지프 씨가 느끼시는 한국 특유의 정서가 있나요?또한 한국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A.한국의 온돌이 특이해요. 장점은 편하고 맛있게 음식을 나눠서 먹어요. 단점은 신발 벗고 들어가는 방식이 너무 힘들어요.Q.지프 씨의 실력 정도면 홀로 한국에서 돌아다니셔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한국 여행은 자주 오시나요? 만약 오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여행하시는지, 특별히 좋아하시는 곳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A.한국 여행을 세번 갔어요. 한국에 있는 언어교환 파트너와 직접 만나요. 한국에는 무지 좋은 곳이 많아요. 특히 남이섬, 해동용궁사, 수원화성, 유성온천, 월미도, 경주 마을, 명동, 독립기념관, 전주 한옥마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Q.혹시 올해 8월에 열리는 BIC에도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A.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쌍근에 관해Q.쌍근에는 아무 단어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닌, 실제로 있고 쓰이는 단어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추가되지 않은 단어도 있구요. 이 단어들은 지프 씨가 수동으로 직접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단어를 추가하는 방법이나 규칙이 있나요?가령 국어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던가, 아니면 대중적인 단어만 모아진 문서를 참고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네, 제가 모든 단어를 수동으로 직접 추가해요. 사전에 있는 단어를 무조건적으로 추가하면 안 돼요. 사전은 역사적인 인물의 성함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도시 이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어들이 입력한 단어를 보고 확인해요. 사전에 없는 말도 자주 입력하셔서 줄임말, 유행어, 욕 등도 추가했어요.Q.표준어와 정식 단어만이 아닌, 비속어와 은어도 쌍근에 추가되어 있던 건 좀 놀라웠습니다.그런 단어는 어떻게 알게됐는지, 그리고 추가한(혹은 배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A.게임 암호는 욕과 슬픈 말을 쓰지 않지만 플레이가 자유롭게 퍼즐을 풀어야 해요. 아시는 어휘만큼 입력하면 괜찮아요. 욕을 싫어하시는 플레이어가 있다면 욕을 입력하지 마세요. ^^;Q.현재 쌍근에 추가되어 있는 단어의 수는 총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도 계속 추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목표치가 있나요?A.원래는 6000개 정도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지금 한 16000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매주 1000개의 단어를 추가해요. 매주 100개의 단어를 입력하는 것이 목표예요.Q.매일 갱신되는 쌍근의 정답은 직접 정하시는 건가요?혹시 추후에 랜덤으로 정답이 배정되어 무한으로 즐길 수 있게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혹은 스팀 출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2028년까지 정답을 준비했어요. 대부분의 정답이 랜덤이였는데 특별한 날짜에 정답도 있습니다. 무한 모드라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가지 모드를 개발해 보고 있어서 모드가 재미있게 만들어 진다면 꼭 업데이트를 할거예요. 지금 스팀 계획이 없지만 미래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Q.향후에 새로운 채소, 규칙, 모드(가령 세 글자 맞추기 등)를 추가하실 계획이 있나요?A.그럴 수도 있는데 <쌍근>을 개발했을 때 친구들이 테스팅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다른 야채 규칙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2자모음이 일치했을 때 🍒버찌가 보였어요. 다른 정확한 힌트도 써 봤는데 정답이 빨리 떠오르면 재미가 없어졌어요. 플레이어는 의심이 든 느낌이 무척 중요해요.Q.쌍근 외에 다른 게임의 개발 계획이 있나요?A.네, 저희 회사에서 큰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비밀입니다. 지금 인디 게임은 <쌍근> 밖에 없습니다.# 게임에 관해Q.지금까지 했던 한국 인디 게임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게임은 무엇인가요?A.<사망여각>이 너무 멋있죠? 한국 문화가 담긴 스토리가 있으면서도 등장인물들이 매력적으로 웃겨요. 무기, 적, 애니메이션, 소리, 음악도 최고요.Q.지금까지 했던 게임 중에서 가장 재밌게 플레이 했던 게임은 무엇인가요?더 보기https://naver.me/F2ilQTLx &lt;포탈&gt; 개발자가 한국어로 게임을 만들었다고? 28문 28답, 지프 바넷 인터뷰[BY 인디커넥트] 퍼즐 게임 역사에 불후의 명작으로 남은 &lt;포탈 시리즈&gt;. 그 &lt;포탈&gt;의 개발자 ...naver.me
작성자 : 필로_R고정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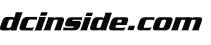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